이번엔 심리학 실험에서 흔하지 않은, 큰 규모의 돈에 관한 실험입니다. 확실히 펀딩이 많으니까 섹시한 연구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참가자들에게 10,000달러를 투척했어요. 한화로는 약 1300만원입니다. '미스테리 실험'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10,000달러를 주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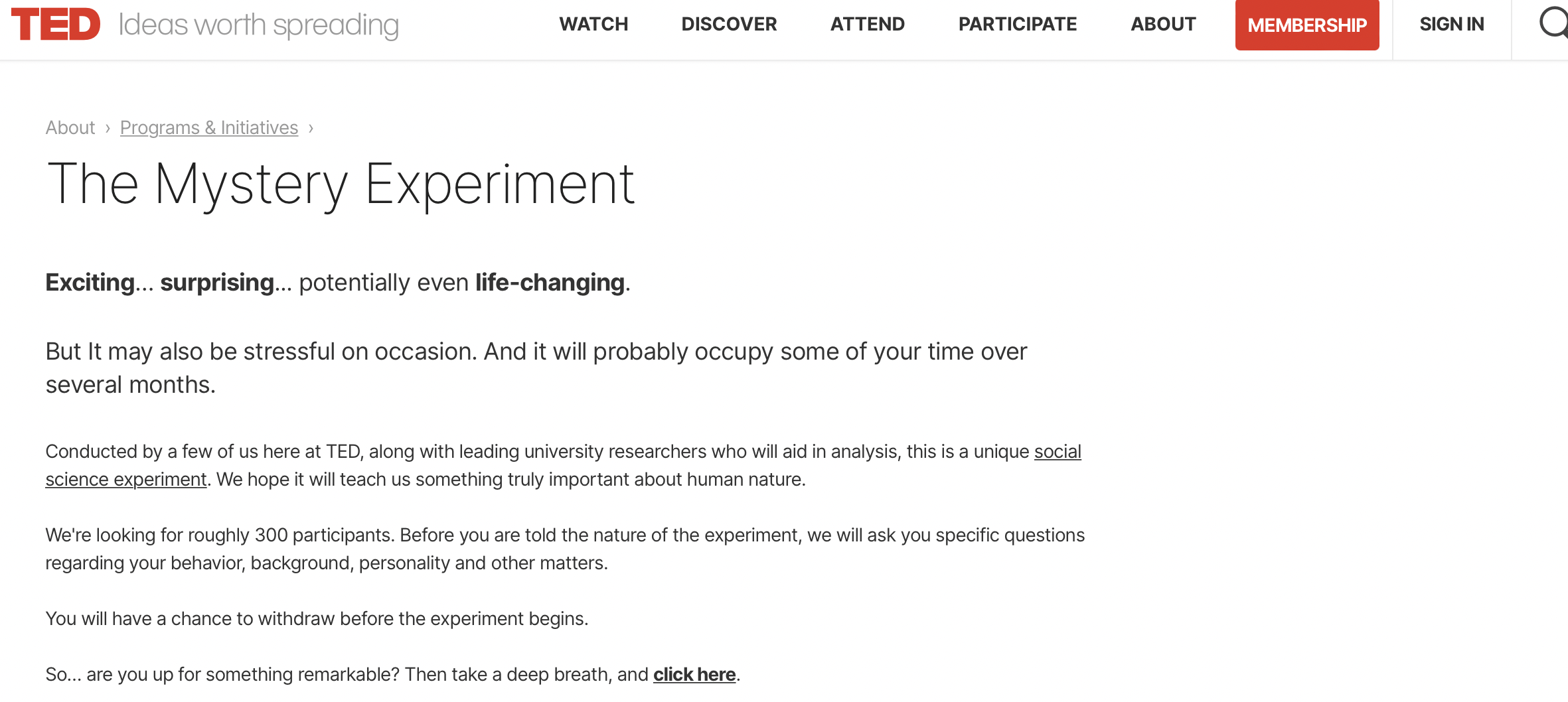
왜 이 실험을 했냐면, 돈 쓰는 것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관대한 존재인지, 혹은 철저히 자기 이익에 우선하는 존재인지를 밝히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지출이니까요. 실제 상황에서 지출을 어디에다 하는지를 보면, 즉 자기에게 돈을 쓰는지 타인에게 돈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로 실제 돈을 주면서까지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게임인 '독재자 게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요. 독재자 게임은 이런 겁니다. 작은 돈을 받고서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 다른 참가자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독재자 게임을 다 분석해봤더니,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28%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즉, 우리는 지출에 있어서 28% 정도는 남에게 나눠주는 관대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첫번째는, 돈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니냐?
두번째는, 그래봤자 실험실에서 일어난 상황이잖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가 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실험실에서 겨우겨우 이루어졌던 실험이었던 덕에, 이렇게 10,000달러를 쾌척하는 미스테리 실험을 짜버립니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큰 돈을 받아도 사람들은 관대한 소비를 과연 할 것인가?
얼떨결에 큰돈을 받아버린 참가자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몇가지 세팅을 정해놨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1.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가 출신이어야 함.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 모두를 모집해야 함.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펙트럼을 반영하여 국가의 소득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임.
2. 타인을 위한 지출이 본인의 평판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이걸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할 것임. 참가자들을 반반 나눠 한 그룹은 트위터에 지출 내역을 공개로 올리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임. 이걸 공적 조건의 참가자들과 사적 조건의 참가자들이라고 하겠음.
3. 세금 떼지 말아야 함! 세금 떼는 나라는 제외해. 10,000달러 고스란히 받아야 해.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제외되었습니다..
-> 즉, 우리는 세금을 떼지 않는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최소한 영어를 사용할 줄 알고, 트위터 계정이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무작위로 공적 조건과 사적 조건에 할당할 것임. 그리고 트위터에 올려야 하는 그룹은 #MysteryExperiment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지출 내역을 올리게 할 것임.
그래서인지 아직도 트위터(현재로서는 X..)에 #MysteryExperiement 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아직도 이 포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00달러를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요.
자, 그럼 실험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현실에서 10,000달러를 받아도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소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인에게 쓴 소비는 총 45~64% 정도였습니다. 그중 20~30% 정도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낯선 사람, 지인, 기부)에 대해 썼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1500달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지출은 어느 국가 출신인지에 대한 영향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타인에 대해 이만큼을 사용했고, 공적 조건이냐 사적 조건이냐도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만큼은 타인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매우매우 보수적인 정의를 사용했을 때(자기자신이 완전히 제외된 오직 타인에게만 쓴 비용)에 22%를 타인에게 썼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실험실의 실험인 28%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느 정도 관대하다는 결과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22% 정도는 기꺼이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대함'이 어느 정도는 본능적인 거고,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돈을 나눠주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기부금도 상당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기부는 오로지 선의에 의한 행동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큰 돈이 생겼을 때 남에게 나눠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도 기꺼이 한다는 것이죠.
이는 어느 나라에서 왔든, 내 평판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이 실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많이 써서 자기 이익에 반해지는 정도라면 기분이 나빠지겠지만, 22% 정도를 쓰는 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실험이 어느 정도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참가자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10,000달러를 받게 되고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다 써야 하는 조건에 할당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남에게 관대함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여 저축을 해야할 때, 그리고 급여와 같은 매번 비슷한 회계로 자금을 운용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1300만원 정도를 꽁으로 얻어서 다 써버려야 한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기부도 할 수 있죠 ^^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도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고 느낄 때, 혹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때 인간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잃게 된다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년 간 재테크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려 하게 되고,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많이 잃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관대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어느 정도는 베풀며 살아가고 싶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라는 것. 그러니 이 인간성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회계를 굴려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일조보다 많은, 22%라는 수치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잖아요.
전체 논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9567976231184887
Dwyer, R. J., Brady, W. J., Anderson, C., & Dunn, E. W. (2023). Are People Generous When the Financial Stakes Are High? Psychological Science, 34(9), 999-1006.
'Study > neuroscience & psych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플라톤 칸트 존 듀이 미학 비교 (0) | 2022.12.04 |
|---|---|
| 배고픔의 뇌과학: 렙틴(leptin), 그렐린(Ghrelin), 도파민 (0) | 2022.08.28 |
| 인간의 세 가지 뇌 - Reptilian Brain, Limbic System, Neocortex (0) | 2022.08.05 |

